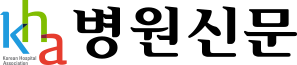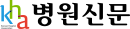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생계형 체납자 보험료부담 경감해 의료이용 제한받지 않도록 해야”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이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 징수대책과 함께 보험료 납부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의료시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 예산기준으로 6년간 1천120억원의 보험료 체납관리비용을 지출했지만 매년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도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8월 현재 6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세대는 153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62만 세대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체납액은 1조9천996억원으로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 2조2천432억원의 90%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0년 4대 보험 징수통합 직전 167억원이었던 체납관리 예산이 2011년 징수통합 후 24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96억원, 2013년 186억원으로 책정·집행됐다. 6년간 1천120억원, 징수인력만 2천500여 명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한해 200억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료 체납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보험료 체납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54만, 2013년 7월 156만건으로 체납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2011년 1조9천억원이었던 체납금액은 2013년 7월 현재 2조2천43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에는 징수가 극히 어려운 25개월 이상 체납 74만 세대를 포함해 1년을 넘긴 체납 세대수는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도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도 상당수에 이른다.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 모 씨(48세)의 경우 월보험료 2만5천730원을 내야 하지만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도 소득이 적어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3개월치 보험료 155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1톤 화물차로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모 씨(40세)는 2명의 가족과 600만원 전월세에 살고 있지만 경제사업이 어려워 결국 월 2만3천480원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40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급여제한자'는 2012년말 기준 171만명.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총 131만건의 부당이익금 6천500억원을 징수하고자 독촉했지만 정작 공단이 거둔 부당이익금은 63억원으로 징수율이 극히 낮다. 오히려 체납후 진료비 독촉고지 비용 62억원보다 적다.
급여제한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지만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의료사각지대만 확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장기체납자 양산 → 진료제한 → 의료사각지대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행정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해결책이겠지만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의 부담능력을 뛰어넘는 보험료 부과로 불필요한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및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