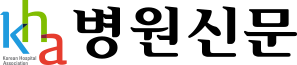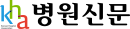아픈 기억의 설화가 주는 공포, 아랑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공포 영화가 무엇을 모티브로 했는지. 한국 사람들이라면 어린 시절 전래동화를 읽으면 한번쯤은 만났던 아랑 설화다.
경남 밀양 지역에서 유래된 아랑 설화는 "장화홍련전" 등과 함께 우리네 해원(解怨)설화의 근간이 됐다. 한 마을에 부임하는 사또마다 사흘밤을 못넘기고 죽음을 맞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진다. 호기롭게 한 사또가 부임하는데 밤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원귀가 되어 구천을 떠돌다 나타난 것. 이 사또는 원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살해범을 잡는 한편 장례를 치러줘 여인의 넋을 위로한다.
이를 영화 "아랑"(제작 DRM엔터테인먼트, 더 드림&픽쳐스)은 공포물이자 범죄물로 접근했다. 우선 탄탄한 드라마는 스타일을 강조하는 공포영화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을 극복하며 관객을 영화 속에 빠져들게 한다.
친숙한 소재를 성폭행과 관련한 현대적 사건으로 버무리는 솜씨도 꽤 수준급이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될 뻔한 아랑의 공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 구조가 신선함을 주는 것. 공들인 각본과 감독의 시선이 돋보인다.
다만 귀신의 빈번한 등장은 오히려 공포감을 떨어뜨린다. 귀신이 중요한 캐릭터이기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은 관객에게 내성을 안겨주기 십상.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피의자를 폭행해 정직당했던 여형사 소영(송윤아 분)이 복귀한다. 그의 새로운 파트너는 과학수사계에서 강력계로 갓 넘어온 신참 현기(이동욱). 살해된 사람은 불에 타 죽었지만 이미 그 전에 질식사했다. 그는 죽기 전 한 통의 e-메일을 받는다. 이 메일은 "민정이의 소금창고"로 링크된다.
수사 중 또 한 명이 살해되는데 피해자 두 명이 친구라는 게 드러난다. 유품에서 발견된 사진 속에는 네 명이 웃고 있다. 또 한 명마저 살해되고 남은 것은 의사 동민(이종수). 몸속에서 유포되는 독가스에 의한 살인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동민에게 초점이 모아진다.
소영은 피해자들이 모두 죽기 전 똑같은 메일을 받았다는 걸 밝혀내고 홈페이지 속 소금창고를 간다. 그곳에서 네 명이 10년 전 폭행치사에 가담했고 그 중 첫번째 피해자가 죄를 혼자 뒤집어쓰고 8년간 복역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들은 마을 소금창고에서 가장 예뻤던 민정이를 강간하다 이를 뒤늦게 알고 달려온 민정의 남자친구를 살해했던 것.
의문이 남는다. 죽은 것은 민정인데, 귀신 민정의 곁에는 꼭 어린 소녀가 따라다닌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전혀 다른 화면 톤으로 "엄마와 딸"이란 그림이 있다.
소영은 이 사건을 추적하며 자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린다. 소영 역시도 성폭행을 당했던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해 단 하루도 편히 잠을 못자는 것.
"첫사랑을 찾겠다"며 형사가 됐다는 현기의 대사, 신체 내부에서 유포되는 독가스를 설명하는 검시요원의 대사, "넷은 너무 적고, 다섯은 너무 많아"라는 소녀 귀신의 대사 등 사건의 단서는 곳곳에 배치돼있다. 그럼에도 관객이 마지막 순간까지 귀신의 정체와 범인을 눈치채지 못하게 한 솜씨가 한 편의 슬픈 이야기로 만들어낸다.
"페이스"에 이어 또 공포영화에 출연하게 된 송윤아는 힘주지 않는 연기로 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튀지 않는다는 것은 묻힐 수도 있다는 뜻. 그 경계선을 잡기가 애매했을 텐데 연기 관록으로 이를 받아들인 인상이 짙다.
"아랑"으로 영화 데뷔한 이동욱의 연기도 눈여겨볼 만하다. 큰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노력한 티가 역력하다. 민정 역을 맡은 신인 김해인의 해맑은 미소도 공포영화답지 않게 따사롭다.
영화 마지막 부분 소영의 과거와 민정의 아픈 사연이 교차되는 지점은 애잔하면서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자막이 올라갈 때쯤 붙여지는 사족이 귀신의 공포감을 더욱 극대화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족으로 느낄지는 관객의 몫이다.
"■ing" 조감독을 거쳐 첫 장편 연출을 한 신예 안상훈 감독 작품.
28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