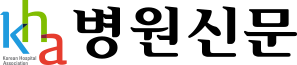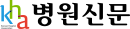의료질평가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새로 도입된 수가다.
선택진료는 지난 2000년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간 의사 인건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특진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특진제는 국립대병원에 이어 사립대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며 지정진료제, 선택진료제로 변화를 계속하다 박근혜 정부 때 3대 비급여 개선이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금은 거의 폐지 수순에 이르렀다.
정부에서 의료서비스가 아닌 병원이용의 추가비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선택진료제를 없애면서 손실보상을 해 준 것은 저수가의 간극 해소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완화 등 선택진료가 가진 순기능 때문이다.
정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무턱대고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다. 선택진료를 시행 중인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질에 따라 차등보상하는 원칙으로 접근했다. 손실보상을 의료의 질을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진료 시행률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과 병원급에서는 예외적으로 전문병원에 한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적용했다. 전문병원은 선택진료 시행률이 51.6%로, 평균 12.5%에 불과한 병원급보다 월등히 높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하는 것과 때를 맞춰 2015년과 2016년 의료급여 수가 산정기준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의료급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예산 의존도가 높은 의료급여의 특성상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환자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큰 의료기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점이다.
의료급여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에 대한 보상은 커녕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지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예산을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공공성을 외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