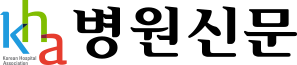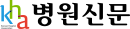오랜 우리 민족사 중에서도 한국전쟁은 가장 참혹한 시련 가운데 하나였다. 전쟁은 모든 것을 황폐화시켰다. 백병원과 나에게 있어 1950~60년대는 위기의 시절로 기억된다.
1952년의 백병원은 설립자 백인제 박사가 납북되시자, 존립이 위태로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설립자의 높은 뜻을 그냥 무산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백병원의 옛 영광을 지키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하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 백병원은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당시 백병원은 의사 8명, 간호사 10여 명, 의료지원부서 15명 등 30여명 규모로 짜여있었으며, 병상은 최대 100병상이었으나 1959년을 고비로 점차 정체,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처럼 백병원이 중소병원 규모의 현상유지에 그쳤던 반면, 서울 곳곳에서는 신생 대규모 종합병원이 신설되었다. 이미 1950년대에 세브란스병원이 세워졌고, 길 건너편 명동 입구에 1962년 명동 가톨릭 성모병원, 1968년 필동 성심병원이 세워졌으며, 을지로 5가에 국립의료원이 신축된 것도 그때쯤이다. 사립병원으로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든다는 자부심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병원 건물이었다. 노후하여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도달해 건물 여기저기 비가 새고, 진찰실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는 상태였다. 병원의 중흥(中興)을 위해서는 최소한 300병상을 가진 연건평 5천평 이상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이는 당시의 백병원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더욱이 유능했던 의료진이 하나씩 병원을 떠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내게는 백병원 5년 선배로 가장 가까운 사이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윤덕선 박사가 미국유학을 다녀온 후 가톨릭대학교로 옮겨 가톨릭 의대와 성모병원을 개교, 개원했다. 후에 필동 성심병원을 세워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의 주역이 되었고, 한강성심병원을 세워 한림대학을 설립했다. 이어 전현오 박사는 경찰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현구 박사도 강릉에 외과병원을 개원하면서 백병원을 떠났다.
월급조차 제대로 지불 못하는 처지에 유능한 의료진이며 재건 멤버들이라 해도 그들을 붙잡을 도리가 없었다. 결국 1963년 3월 제2대 원장 김희규 박사도 재단 해체라는 마지막 처방을 내리고 가톨릭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나는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다. 백부인 백인제 박사와 부친인 백붕제 변호사가 재단법인 백병원을 세운 뜻을 저버릴 수 없었다. 백병원에는 나와 김경식, 김헌종, 서상완 등 몇몇 동료와 후배들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점점 환자수가 줄어들었고, 병원 운영은 더욱 어려워져 백병원은 일대 위기를 맞았다.
백병원도 결단을 내릴 때가 왔던 것이다. 그야말로 앉아서 망하느냐, 아니면 새 병원을 짓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해보느냐 하는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사실 당시 백병원 재정 사정은 말이 아니었다. 김희규 선생이 병원을 책임지고 있을 때만 해도 나는 전혀 병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오로지 외과의사로서 진료와 연구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재정 사정이 그렇게까지 열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백병원은 소생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퇴원결정(hopeless discharge)이 내려진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맡겨진 것이었다.
젊은 나이에 병원을 짊어지게 된 내 운명은 이제 무거움, 그 자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