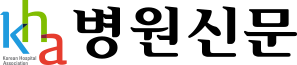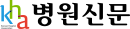의료계와 약계, 정부가 지루하게 맞섰던 의약분업 사태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이번 사태가 내용은 달라도 진행양상은 얼추 비슷해 보인다.
의약분업 당시에도 수십차례의 의·약·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것이 당시 의료계 대표와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 돌파구를 찾았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내렸지만 진료수가 인상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조제를 제한하는 기관분업으로 타협점을 찾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번에도 최고 통치권자인 윤석렬 대통령의 결단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00명의 의대정원 확대가 국회의원 총선의 전략이었든, 의료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든 이제 남아있는 카드는 최고 통치권자의 결단만 남아있는 것 같다.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의사들의 선택이라기보다 의사들을 필수의료나 지역으로 유도하지 못한 정책당국과 정치권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익구조가 없는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보는 손실을 외래나 검사 등을 통해 벌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재정논리에 막혀 손대기 힘든 수가결정구조.
조세저항을 우려해 턱밑까지 바싹 차오른 보험료율을 개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정치권의 눈치보기.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찾아 차근차근 개선할 생각보다는 의사와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는 듯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 보니 수십년간 일궈놓은 의료인프라가 일거에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의약분업 당시, 진료수가 인상으로 개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의사인력이 대거 개원시장으로 유출된 시점부터 의료기관들의 의료인력난이 시작된 것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면, 의대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병원계는 의약분업 때처럼 어떤 방향으로 전개돼 어떻게 결말이 날지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지출을 아껴 어떻게해서든 견뎌내 이번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면 제약과 의료장비산업에 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때 진료비를 선지급하고 융자지원을 통해 의료인프라를 지키려 했던 그때의 정부가 맞는가 싶다.
병원이 없으면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도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
정부도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금과 같은 의료인프라를 재생성하기 힘들 것이다.
버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정 양측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