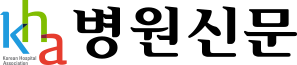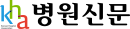초보 직장여성의 패션계 분투기
썩 볼 만한 성장영화다. 미국에서 기대 이상의 박스오피스 성적을 거둘 만큼 관객과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영화다.
로렌 와이스버거의 동명소설은 2003년 출간 이후 27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국내서도 올해 5월 출간되자마자 소설 부문 1위 자리를 한동안 놓치지 않았을 정도로 히트했다.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했음에도 이 같은 흥행을 기대하지 못했던 건 톰 크루즈나 톰 행크스의 영화 한 편 출연료 정도인 "고작" 3천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졌기 때문. 제작비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블록버스터도 흥행을 확신하기 어려운 판에 이 정도의 제작비로 미국에서만 "무려" 1억2천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였다.
이 영화의 흥행은 각본, 감독, 배우의 절묘한 조합에 있다. 원작을 잘 다듬은 각색은 기초공사를 다졌다. "섹스 앤 더 시티" "밴드 오브 브라더스"와 같은 TV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영상어법과 시청층 공략에 성공했던 데이비드 프랭클 감독은 촘촘하면서도 스타일이 넘치는 영상을 만들어냈다. 과감한 편집과 영상에 어우러진 음악의 묘미는 패션을 소재로 한 영화에 딱 들어맞으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록 있는 메릴 스트립과 풋풋한 앤 해서웨이의 조합이 환상적이다. 메릴 스트립은 그 무서운 "런어웨이" 편집장 미란다를 다면적인 여자로 완벽하게 표현해냈다. 메릴 스트립의 출중한 캐릭터 소화를 통해 자칫 앤드리아의 고군분투가 될 수 있었던 영화는 무게 중심을 확실히 잡아냈다.
또한 연기 경력이 많지 않은 앤 해서웨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좌충우돌 20대 여성 앤드리아에 적역이 됐다.
사회 초년병이 직장에 적응해 가는 과정은 "런어웨이" 편집장의 비서만큼은 아니더라도 낯설고 고달프다. 패션은 "베르사체"조차 모를 만큼 문외한인 시골 모범생 앤드리아가 이를 악물고 직장에서 버텨 나가는 과정도 너무나 현실적이며, 패션계의 절대지존으로 군림하며 직장 후배를 하인 부리듯 하는 미란다의 모습 역시 결코 낯설지 않다.
앤드리아가 조직의 단맛, 쓴맛을 알아가는 한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피엔딩. 그러나 이 해피엔딩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른 가치관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영화를 보는 사고의 폭이 넓어진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개인의 몫이다.
다만 마지막 반전이 너무나 급작스러워 그 상황을 음미할 시간이 부족한 것은 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잘 빠진" 영화임은 분명하다.
앤드리아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소도시 출신이지만 저널리스트의 꿈을 안고 뉴욕에 온다. 아무곳도 찾지 않지만 단 한 군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패션잡지 "런어웨이"의 비서로 덜컥 채용된다. 그곳에 근무하는 여성들은 44사이즈의 몸매로 명품을 걸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지만 그 누구보다 여왕처럼 군림하는 미란다의 비위를 맞추는 건 끔찍한 일.
미래를 위해 1년만 버티기로 한 앤드리아는 점점 미란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고, 미란다 역시 앤드리아의 총명함에 기대게 된다. 그러는 사이 앤드리아는 남자친구뿐 아니라 친한 친구와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과연 앤드리아의 선택은?
12세 이상 관람가. 26일 개봉.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