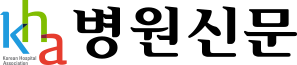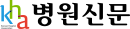덜 무서운 공포 영화, 유실물
합리가 미신을 당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인할 길은 없어도 한번 기분 나쁜 기운을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당연한 논리로 밀어붙여 봐야 소용없다.
길을 가다 쓸만한 선반을 하나 주워왔는데 "누가 한을 품고 쓰던 것인 줄 알고서 집어왔느냐"고 할머니가 호통을 치기 시작하면 그 때는 설득이고 뭐고 다시 내다버려야 하는 것과 같다.
공포 영화 "유실물"도 처음부터 합리를 걷어낸 지점에서 시작한다. 역에 떨어져 있는 전철표와 전동차 의자에 놓여있던 팔찌에는 손대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과거"가 묻어 있다.
유실물이 착한 사람을 만나 주인을 찾아가는 순리는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검은 옷을 입은 검은 머리의 여자는 유실물을 줍는 사람의 목을 번번이 채간다.
사라진 여동생을 찾으러 나선 나나(사와지리 에리카 분)는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의 유실물을 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비밀이 시작된 터널에 손전등을 비춘다.
터널이라는 공간은 엘리베이터나 폐가보다는 덜 지루하다. 앞뒤로 뚫려있지만 한가운데는 칠흑 같은 어둠이 둘러싸고 있어 터널은 적당한 긴장감을 준다.
기술의 발전은 터널을 뚫고 미신의 시대에 안녕을 고하는 것 같지만 정작 산을 둘러싼 이상한 기운을 걷어내지는 못한다.
터널을 팔 때부터 인부들이 귀신에 홀린 것 같아 방향을 바꾸다가 급커브를 만들었다는 "믿거나 말거나"한 얘기는 결말에 이르러 "믿을 수는 없어도 인정해야 하는" 사실로 바뀐다.
공포 영화지만 "유실물"은 한껏 줄을 잡아 당기다 펑펑 터뜨리는 오싹함을 함부로 꺼내들지 않는다. 범죄수사극 "C.S.I" 시리즈만큼도 피가 나오지 않고 잔혹한 장면도 빈번하지 않은데다 검은 옷은 입은 여자는 "전설의 고향"을 떠오르게 해 불필요한 무서움이 덜하다.
감독은 공포 영화의 도식적인 장면들에 집중하기보다 유실물을 계기로 견고해지거나 복원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공포 영화의 전형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다. 하지만 그래서 다소 뜬금없어진 전개가 개연성을 떨어뜨린다.
나나와 카나에가 갑작스레 진한 우정을 나누는 것은 물론 나나가 석회암 동굴같은 터널 안쪽에서 동생을 간신히 구해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픈 엄마에게 돌아가는 설정은 "이웃집 토토로"마저 연상시켜 공포를 모험과 헷갈리게 만든다.
그럼에도 잿빛 분위기가 감도는 전철역과 터널을 배경으로 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유실물이란 소재에 착안한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다만 소재의 흥미가 88분을 끌지 못할 뿐.
지난해 영화 "박치기"로 스타 대열에 합류한 사와지리 에리카가 주연을 맡아 27일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처음으로 관객을 만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