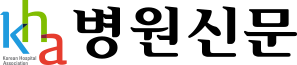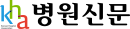저조한 인증률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관 인증 현황’에 따르면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인증률을 100% 채운 종별 의료기관은 한군데도 없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조차 58.6%에 불과하다. 의무 인증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조차 각각 81.5%, 69.7%밖에 되지 않는다.
자율인증 대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1,536개 중에서 9.3%인 143개만 인증을 받았다. 그중에서 의무인증 대상인 전문병원 84개를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은 병원은 59개에 불과하다.
이처럼 인증률이 저조한 것은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실익이 거의 없어 의료기관들이 인증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3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병상 이상 전문병원 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증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2억8,000만원, 건물·시설 수리비 2억5,000만원, 의료기구·자재 구입비 850만원을 합쳐 평균 8억600만원에 이른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중 의무인증 대상인 수련병원을 제외하면 자율 인증을 받은 곳은 몇군데 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증 초기부터 제기됐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정책에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 저조한 인증률이 지적될 때마다 인센티브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검토만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입문인증 후 단계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입문인증’ 추진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현재도 시행중인 사전 컨설팅과 차이가 불명확하고 의료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실제 시행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면에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병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는 한 자발적인 인증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