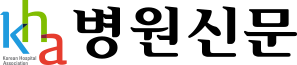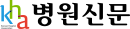볕 바른 병원 한쪽의 아담한 풀숲, 모처럼 겨울 햇살이 따스하다.
듬성하게 색바랜 풀잎 끝마다 역병에 시달리는 세월이 억울한 듯 글썽한 이슬방울.
구슬처럼 둥글게 맺힌 이슬이 이슬방울이다.
이슬방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번지지 않고 구슬 같은 방울이 된다.
풀잎 위의 이슬방울은 풀잎 표면을 구성하는 재료가 물과 잘 접착되지 않기 때문에 구슬이 된다.
이슬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식어서 물체의 겉면에 엉겨 붙어 있는 물방울이다.
수증기, 물, 다 순식간에 스러져 없어지는 헛됨의 상징이듯이, 이슬방울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물리적 변용(變容)의 하나로 덧없음을 이를 때 자주 쓰인다.
특히 허무하게 빠른 세월과 인생을 이슬방울처럼 스러져간다고 한다. 하지만 이슬방울처럼 보이는 모든 게 덧없는 것일까.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영국 런던의 실험실에서 세균배양 접시에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고 있었다.
마침 오랜 친구 프리스가 들렀다.
실험실 안, 배양접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좌우할 무언가 알 수 없는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었다.
플레밍은 프리스와 이야기를 나누며 배양 접시 뚜껑을 열었다.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잠시 배양접시를 관찰한 후, 평소처럼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이상한데......”
플레밍은 당시 상황을 적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곰팡이는 자라고 있었다. 그런데 곰팡이 주위에 포도상 구균들이 죽어서 녹아있었다. 늘 형성되던 불투명한 노란색 덩어리가 아닌 이슬방울처럼 보였다.”
배양접시 안의 이슬방울처럼 보이는 뜻밖의 현상을 보고, 플레밍은 곰팡이가 생산한 무언가가 박테리아를 죽여 녹여버렸다고 결론지었다.
페니실린 발명의 첫 발견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슬방울 같은 그 무언가가 의약계에 대변혁을 가져온 페니실린임을 잘 알고 있다.
1945년 플레밍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페니실린의 발견에 대한 그의 발언도 기억하고 있다.
“페니실린은 내가 아니라 자연이 발명했다. 다만 나는 우연히 발견했을 뿐이다.”
이슬방울을 어느 이는 이렇게 그렸다.
“아주 완벽한 형태를 스스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
이슬의 증발은 불안정하지만, 늘 완벽한 상징으로 새겨진다.
세상 많은 메시지가 그러하다.
세상을 향해 외치던 선각자는 세상을 떠났어도 울림은 살아있고, 만발하던 꽃은 스러졌어도 그 의미는 망막 속에 흠 없이 선하다.
질병도 이슬 같이 세상 메시지를 준다. 생의 연약함과 유한함.
‘질병은 삶을 따라다니는 그늘, 삶이 건네준 성가신 선물’이라는 수전 손택의 말처럼 어차피 감당해야 할 병고라면 질병이 건네주는 메시지에 충실할밖에.
그늘 없는 삶이 어디 있는가.
찰나에 스러지는 이슬처럼 극진히 유약하고 유한한 갈망.
약할수록 강건을, 유한할수록 영원을 소망하는 그늘 아래 갈망.
찰나의 집중으로 반짝이다 증발하는 이슬에 기대어 세월을 측량하는 일이 갈망 아닌가.

세월은 흘러간다고 대개 이르지만, 이는 세월의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한 착시의 하나다.
어느 누구나 차를 타고 가노라면, 별안간 길가의 가로수와 건물들이 뒤로 뒤로 줄지어 달려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차가, 또한 차에 탄 내가 앞으로 달려갔지만, 순간적으로 가로수며 집이 뒤로 간 것처럼 착각 한 것이다.
혹시 쌓였다가 허물어지거나 색이 바래고 문드러져, 뭐가 뭔지 분간할 수 없이 섞여 버리기도 하지만 세월은 쌓여간다.
애정이 쌓이고, 우정이 미움이 억울함이 쌓이고, 지식도 덕도, 추억도 슬픔도 쌓이고 쌓인다.
우리네 인생사와 연분이 있는 모든 일들이나 속내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죄다 들먹이면서, 뒤에 ‘쌓인다’라는 말을 붙이면 어느 하나 어색한 것이 없다.
지나간 머언 기억을 내가 잊은 것이지, 기억이 세월에 얹혀, 기억이 세월 따라 흘러간 것이 아니다.
세월이 기억을 씻어 간 것이 아니다.
의식에서 잊혔다 하더라도 무의식 어딘가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
이른바 문득, 불쑥, 뜬금없이 떠오르는 아련한 대소사를 어느 누가 세월 따라 흘러갔다고 하는가.
세월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작디작은 일이라도 온전하게 쌓여간다.
내 육신 안팎에, 내 정신 안팎에 온전히 지니고 있다.
바스락. 겨울밤, 모두 퇴근하고, 새로 바뀐 전자병록 시스템을 쫓아가느라고 밀린 병록을 헐떡이며 채우는 시간.
내일의 이슬방울을 빚으려 찬바람이 이슬점에 닿아 응축하며 내는 소리인가.
문득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진료실 한 귀퉁이, 오래전 감색 보자기에 쌓아두었던 원고지 뭉치를 꺼내어 본다.
욕망이 응집하고 열정이 보태어져, 이슬방울보다 빛나는 금강석에 갈망을 먼저 주며, 진료실 풍경을 일상으로 여기던 시절.
때론 점점이, 때론 띄어쓰기 한 곳 없이 붙여 쓴 젊은 날의 진료 일지 속, 어느 오후의 외래를 떠올린다.
그런 세파(世波)를 / 손가락이 집어 가고 / 발가락이 몰아간 // 언제나 그다음 날 / 손가락 비슷한 / 발가락 비슷한 / 병들이 외래를 찾아온다 // 그들과 까막잡기하여 / 장 간호사나 심 간호사가 처방전을 챙겨주면 // 피이식 웃음으로 / 그들은 하오(下午)를 / 손가락인 양 / 발가락인 양 / 보따리에 싼다 - 유담, 「외래」 전문
그리 넓진 않아도 진료에 관한 온갖 구색이 알차게 들어 차 있던 당뇨병 클리닉.
진료 시간이면 모든 손과 발을 불러 모아 북적거리던 한창 시절이었다.
병록 번호와 환자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외우던 심 간호사, 무통 신속하게 혈당을 첵크하던 장 간호사.
분주함 속의 진지함이 가꾸어내는 그녀들의 손발에, 긴 진료 대기에 지쳐 굳었던 표정을 기꺼이 녹여 미소로 화답해주던 환자들.
이슬처럼 빛나던 젊은 날, 진료실 한낮의 선연한 정경이 보따리에 가득하다.
이슬방울이 곧 사라지더라도 생김새가 변용되었을 뿐, 이슬 빚던 그 의미와 수고는 몸 안 깊이, 때론 고황(膏肓) 깊숙이, 그 습기 그대로 눅진하게 쌓여 있다.
진료실의 세월, 아니 진료실이 이슬방울처럼 고스란히 맺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