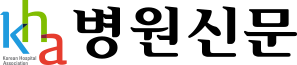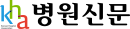사실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인 현행 수가협상 시스템하에서는 아무리 병원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설득해도 절벽에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진료량 증가폭이 다른 유형보다 큰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았다. 단지, 진료량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를 병원계 스스로 정해 공단의 선처에 호소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묘책이 없었다. 무기력을 느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공단 협상단의 눈치를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방법도 병원계의 현재의 처지를 반영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병원계가 카드를 만들어 제시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나마 구체성이 결여된 부대조건안은 가입자에게 수용되지 않았다. 그나마 병원계의 처지를 감안한 공단 협상단의 노력으로 부대조건없이 1.9%라는 성적표를 올린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겨할 판국이다.
이런 수가협상에 과연 ‘협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는게 맞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
공단 재정소위원회를 오가며 유형별 협상상황을 전하고 수가 인상안을 받아 와 유형별로 협상을 하고 있는 공단 협상단을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단 재정소위가 뒤에 버티며 공단 협상단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의 권한도 없는 공단 협상단에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가입자 위주로 구성된 공단 재정소위에서 병원계의 어려움을 이해할 것을 바라는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환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치료받기를 원해 진료량이 증가하는 것이 병원계의 잘못일까. 미국에서도 문제가 있어 이미 폐기돼 버린 SGR 모형을 우리나라 수가조정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이해하기 힘든 의문이 꼬리를 문다.
공단측 논리대로 라면 병원계 살림이 바닥이 나야 조금 수가를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67곳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9곳이 휴업했다. 폐업률도 환산하면 8.4%에 이른다. 얼마나 더 망해야 하는 것일까.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