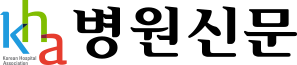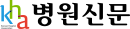간호사 명찰을 달고 파란 수술복을 입기 시작한 이래로 나의 계절은 무려 두 번이나 바뀌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직 신규간호사인 탓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느라 병원에서는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힘들지만 이런 나라도 계절의 변화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가로수 밑이다.
기숙사에서 병원으로 출근하려면 많은 가로수 밑을 지나야 한다. 한 때 녹음을 자랑하던 가로수의 가지들은, 한 해의 막바지로 접어들자 더욱 더 거칠고 앙상해졌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처량하지는 않다. 앙상함은 잠시 뿐이다. 그 가지들은 금세 가지각색의 색깔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 수술실에서 마스크와 수술모를 쓰고 일한다. 그러다 보니 불안한 눈으로 환자가 수술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단지 목소리와 눈빛 밖에는 전달해 줄 것이 없었다. 더욱이 나같이 어리바리한 신규간호사에게는 환자확인을 위한 Time out만으로도 환자에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이었다. 매일 같이 베타딘 소독제 범벅이 된 소독솔로 손을 씻다보니 친구들보다도 부쩍 거칠어진 손이, 출근길의 그 가로수 가지 같다며 엄마에게 불평을 한 바로 그 날이었다.
환자는 입실 과정에서부터 수면유도 마취인 탓에 몹시 불안해했다. 수술과정 중에 통증을 견디지 못해 아파하던 환자는 수술이 종료된 후에도 서러움을 견디지 못해 몹시 울고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환자의 등을 두드리는 내 손을, 어느 순간 환자가 슬그머니 잡고 있었다. 환자는 수술침대에서 이동 카로 옮겨갈 때까지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었다. 환자가 수술방 밖을 나가야 했기에 손을 빼려는 찰나 ‘고맙습니다’라는 듯이 환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나에게 미소를 지어 주었다. 그 때의 기분이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지금도 그 날이 종종 떠오르곤 한다. 그 환자는 나에게 무엇이 고마웠던 것일까. 사실 그 환자의 손은 매우 따뜻했다. 부디 그에게도 내 거친 손이 따뜻했길 빈다. 나보다도 훨씬 거칠고 단단한 우리 수술실 선생님들의 손이, 수술 방을 거쳐 간 환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부드러웠기를 빈다. 불과 몇 분 안 되는 짧은 시간들이지만 환자들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거칠고 단단한 우리의 손은 결코 볼품없지 않을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 많은 손들을, 더 따뜻하게 잡아 줄 수 있기를….